[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데뷔 30주년을 맞은 대배우지만 연기와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유 때문일까. 짧은 질문에도 섣불리 답을 내놓지 않는다. 화두를 던지고 나선 한 편의 모놀로그를 펼치는 듯 이야기에 막힘이 없고,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로 상대를 초대한다. 배우 한석규(55) 이야기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은 뭘까, 사람은 왜 그럴까… 아마 직업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궁금해요. 아주 좋은 점부터 나쁜 점까지. (최)민식이 형도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 '연기는 죽어야 끝나는 공부'라는 말을 했겠죠."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감독 허진호) 개봉에 앞서 만난 한석규는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다. 많은 배우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논문을 읽어 내려가듯 쉼 없이 문장을 구사하는 이는 처음이었다. 다소 일방적이었던 대화가 즐거웠던 이유는 진중히 고민하기도,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티 없는 아이처럼 웃기도 하는 그의 모습 때문일 테다. 이야기의 시작은 연기관이었다.
"'액트'(act)라는 일은 내가 아닌 남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고 또 하다 보니 그게 아니다… 결국 연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거고, 내 꼬라지를 벗어나는 연기를 결코 할 수 없겠구나. 내 상상력,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는 거니까. 내 연기가 좋아지려면 내가 좋아져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좋아진다는 건 뭘까… 연기를 잘한다는 건 뭘까요? 난 후배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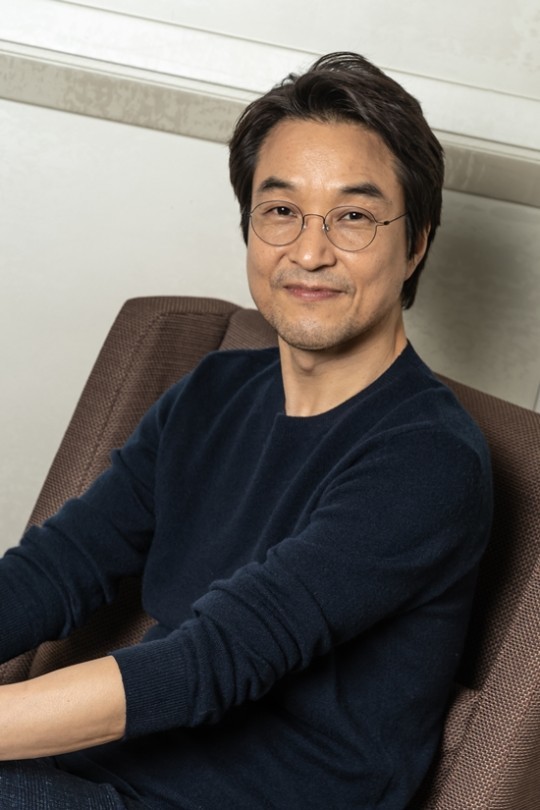 |
|
| ▲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의 배우 한석규가 미디어펜과 만났다.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
한석규는 강렬한 열연을 펼친 '우상' 이후 9개월 만에 '천문: 하늘에 묻는다'로 돌아왔다. '천문: 하늘에 묻는다'는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만들고자 했던 세종(한석규)과 장영실(최민식)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작품.
2011년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를 통해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는 세종을 이미 연기했던 한석규는 이번 작품을 통해 또 한 번 세종으로 분했다. '뿌리 깊은 나무' 촬영 당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종을 연기했다면, 이번에는 어머니의 영향에 대한 생각이 컸다고 한다.
"친정 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한 민씨. 이도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착해지려고 이를 악물었을 것 같아. '난 절대 함부로 사람 죽이지 말아야지' 하고. 세종은 분명 엄마를 엄청나게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만 생각하면 그 측은한 마음… 자식들은 엄마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이도와 엄마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게 됐죠.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이도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장영실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까. 그래서 훈민정음도 만들고. 물론 '내가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런 걸 한다' 그런 소리는 안 하셨을 거야. 이걸 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전하, 말짱 황입니다 그거', '그냥 말 안 듣는 애들은 죽이세요', '살려봐야 골치만 아픕니다' 그런 논조겠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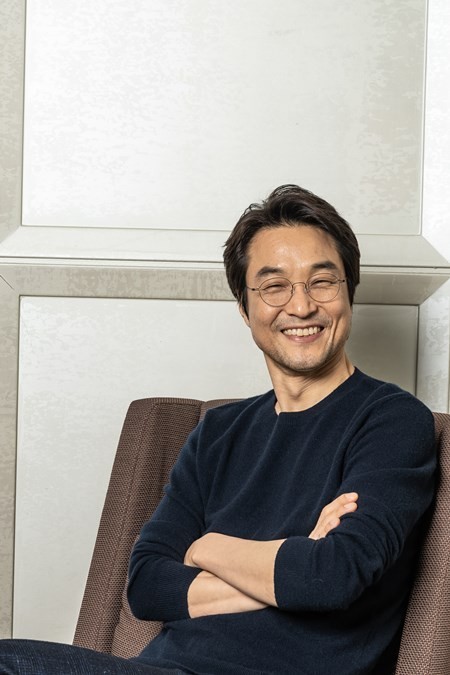 |
|
| ▲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의 배우 한석규가 미디어펜과 만났다.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
한석규는 '천문: 하늘에 묻는다' 촬영에 임하며 발휘한 역사적 상상력을 더해 세종의 가족사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세종의 애민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간단한 재연까지 선보인 그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관심 없어한다"며 불쑥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근데 이런 거 다 관심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이구나', '연기는 곧잘 하는데 갔구나', '4차원이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자리는 너무 힘들지. 첫 만남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주로 돈, 정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 누구 지지해?', '요즘 어디어디가 도움된다는데 관심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인생이 선택의 연속인데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면 '허허허', '미친놈이네'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면 민식이 형은 '석규야,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 근데 그 내용이 나와 비슷해. '형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런데'. 이게 세종과 장영실의 모습이겠지.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1999년 영화 '쉬리' 이후 20년 만의 뜨거운 재회를 이룬 최민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모습이었다. 동국대 연극영화과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떨어져 지낸 시간도 길지만, 연기에 대한 뜻과 삶의 색이 통하는 몇 안 되는 동료다.
"값싼 거리 공연에 확 빠져서, 흥에 취해서 몸을 흔들어본 적 있으세요? 민식이 형과 전 거기에 쑥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유형의 인간이야.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어떤 성향의 사람은 무언가를 볼 때 반응이 미적지근한데, 그 형과 나는 넋을 놓는 사람이지. 그래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우릴 보면 이상하지.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노냐."
물론 다른 사람들처럼 최민식과 통속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운 적도 있단다. 한석규는 "민식이 형과 '1억 생기면 뭐할까' 상상하며 리스트를 적은 뒤 '야, 4500만원이 남는다' 하곤 했다"면서 "지금은 안 한다. 돈에 관심이 없어졌다. 그 땐 돈을 벌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 놀이를 한 건데, 돈이 싫은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졌다. 그 땐 재밌을 줄 알았는데 돈을 써보니 재미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 |
 |
|
| ▲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의 배우 한석규가 미디어펜과 만났다.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
아무런 수입 없이 시간을 보내던 무명 시절 묵묵히 지켜봐준 어머니가 고마울 따름이다. 대학 졸업 후 정처 없이 떠돌던 1년 동안 늘 담배값과 차비를 쥐어줬던 어머니. 최민식과 함께한 졸업 공연 '올 마이 선스'(All My Sons)를 본 뒤 어머니가 내놓은 "두 놈이 밥은 먹겠네"라는 멘트는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우리 엄마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내가 2000년도에 한 3년 일을 안 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 안 한 거지, 거창한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엄마가 왜 일을 안 하냐고 묻길래 농담으로 '예술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 버는 게 예술이야, 임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두고두고 기억이 나. 모르는 사람이 그 따위 이야기를 하면 별로지만 엄마의 히스토리를 아니까. 엄마는 한국전쟁 나고 미군들 옷 빨래해주면서 우리를 키웠으니까요. 까불면 안 되죠. 시건방 떨면 안 되지."
막내아들에게 각별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자양분으로 소년은 성장했고, 어느덧 한국영화계의 거목이 됐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마주하니 소년의 잔상이 더욱 깊게 남았다. 많은 이들이 느낀 감상이 아닐까. 사사로운 인간사를 복기하고 모든 환경에 물음표를 던지는 한석규에겐 30년간 찍어낸 발자국의 개수와 크기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갖는 의미가 더욱 중요해 보였다.
| |
 |
|
| ▲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의 배우 한석규가 미디어펜과 만났다.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